데리언 니 그리파.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땐 국적이 짐작되지 않을 정도로 기묘한 이름이라는 생각 뿐이었다. 알고 보니 아일랜드 사람이었다. 아일랜드라면 영국 옆 섬나라라는 것,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것을 간신히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크랜베리스와 제임스 조이스가 떠올랐을 뿐. 찾아보니 U2, 데미안 라이스, 시네이드 오코너, 오스카 와일드 등 아일랜드 출신의 예술가들은 끝이 없었다. 아마 데리언도 내게는 그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각인될 듯하다. 오죽하면 책을 덮자마자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팬레터를 남겼겠는가!

아무튼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너무 고풍스럽고 예쁘다는 인상을 받았다. 낱장을 넘기면서 행간, 여백, 밑줄과 취소선의 적절한 사용에 또한 감탄했다. 정성스럽게 편집했음을 여실히 느꼈고, 오랫동안 세계문학전집을 출간해온 을유문화사만의 기품도 느껴졌다.


사실 ‘이것은 여성의 텍스트다’ 로 시작되는 첫 문단은 조금 거창하게 다가왔다. 페미니즘을 내세운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자칫 사상만 앞세우고 문장이 허술하거나 강압적인 작품은 아닐지 걱정이 들었다. 물론 기우였다. 1장을 채 다 읽기도 전에 나는 데리언의 글에 푹 빠졌다.
‘이 분은 사랑으로 가득한 작가구나!’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그러기를 멈추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책 소개에 나왔던 문장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 아이를 기르는 여성 시인의 사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어떻게 작가 데리언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면서도 남편과 애틋하게 사랑하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시달리면서도 끊임없이 시를 쓰고, 또 18세기의 시 한 편에 매료됐다는 이유 만으로 그걸 쓴 시인의 삶을 추적하는 열정을 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액체로 된 메아리다.’ 모유 은행에 자신의 모유를 기증하면서 데리언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유축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원을 그리며 돌고, 돌고, 또 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서 데리언은 또 자신의 문장에 기대어 아픔을 출렁출렁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면서 ‘완료. 완료. 완료. 자그맣게 씌어있는 내 모든 승리’ 라며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취소선을 하나씩 긋는 재미를 고백한다.
나는 미혼이라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지만, 집안일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잘 안다. 사실 바로 이런 생활에 치이는 데리언의 현재 모습이, 오래 전 죽은 아일린 더브를 추적하는 과정에 곁들여지는데, 이로 인해 마치 주부 탐정 소설을 읽는 듯한 옅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실 이 책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아일린 더브 Eibhlín Dubh Ní Chonaill 는 18세기에 살았고 ‘아트 올리어리를 위한 애가 The Keen for Art O’Leary’를 남긴 시인이다. 그리고 데리언은 육아에 시달리는 와중에 그녀의 시를 계속 곱씹다가 결국 그녀의 삶을 복원하기로 결심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Derrynane
Derrynane - Wikipedia
Village in Munster, Ireland Derrynane, officially Darrynane (Irish: Doire Fhíonáin, meaning 'oak-wood of Fíonán'),[1] is a small village in the civil parish of Kilcrohane in County Kerry, Ireland. It is located on the Iveragh peninsula, just off the N7
en.wikipedia.org
(아일린이 유년기를 보냈던 곳, 데리네인)
책의 맨 마지막에는 부록처럼 ‘아트 올리어리를 위한 애가’ 의 원문과 번역문이 동시에 실려 있다. 나는 그 내용이 하도 궁금해서 먼저 시부터 읽었다. 결론적으로는 잘한 일 같다. 시를 내 나름대로 이해한 뒤에야 이 읽어나가는 과정에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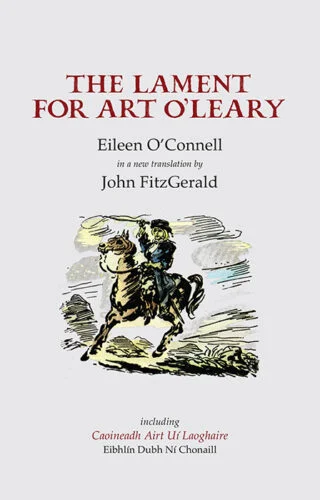
https://roaringwaterjournal.com/2021/11/06/frank-jack-and-eibhlin-dubh-the-lament-for-art-oleary/
Frank, Jack and Eibhlín Dubh: The Lament for Art O’Leary
Caoineadh Áirt Úi Laoghaire (The Lament for Art O’Leary) is a classic work of Irish literature. Composed as a keen by his widow, Eibhlín Dubh Ní Chonail (Dark Eileen O’Connell, pronounced Eileen Du…
roaringwaterjournal.com
(아트 올리어리, 아일린 더브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찾다가 시에 곁들여진 삽화를 발견했다!)
추적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0년 전의 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남성들이 쓴 기록들에 단 몇 줄로 녹아있기 십상이었다. 데리언은 아이를 업고 도서관을 다니며, 수많은 기록을 모으고 밤늦도록 집필을 하다 책상에서 그대로 곯아 떨어진다. 주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자의 모습은 대개 이렇다. 치열하게, 그러나 데리언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다가도, 피곤에 절어서, 매번 ‘아일린 더브’, 목구멍 속의 유령에게 도망치듯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뭔가, 뭔가가 계속 뭉클했다. 나 역시 학교를 다니며 작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처지니까.
아일린 더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쌍둥이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넬리라고 불리던 아일린 더브는 천방지축이었던 모양이다. 열 넷에 떠밀리듯 시집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 약간의 반전이 있다(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 생략한다!). 놀랍게도 작가는 그런 소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10대를 돌이키게 된다. 겹쳐지는 지점들. 갈라졌다가 다시 점으로 만나는 두 개의 인생. 그들 사이에 200여년의 시간이 가로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엮여질 수 있다는 걸 작가는 계속해서 증명해낸다. 심지어 그 문장들은 아름답다. 데리언은 자신의 10대를 해부실의 이미지로 추억한다.
‘나는 그 방에 없었다. 나는 이미 떠난 뒤였다. 나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지만 그런데도 가끔은 억지로 몸을 움직여 해부실로 돌아갔다.’
데리언은 어릴 때부터 치과의사가 꿈이었다. 의대 1년차의 실습이 문제였다. 해부실. 데리언은 처음 해부실에 들어섰을 때 기시감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전 꿈에서 똑같은 해부실을 보았음을 기억해내곤, 실습을 하는 내내 얼이 빠지게 된다. 이곳은 데리언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교사라는 직업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부실에 대한 기시감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었던 것 같다. 각기 다른 시점에, 각기 다른 이유로 결국 해부실에 돌아가는 모습이 나열되는데, 무척 공감이 갔다. 생각해보면 내게도 기묘함을 느끼던 순간이 있었다.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소도 경험한 적 있고.
어쩌면 데리언이 시를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일린 더브의 일생에 애착을 가지며 집요하게 추적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건 아닐까? 남들이 감각하지 못하는 걸 포착하는 예리함. 그리고 풍부함. 사랑.
‘한 여성의 삶을 내 앞에 두고 그것을 이루는 각각의 층을 천천히 탐구하고 싶다는 충동은 아마도 해부실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행동 양식 대부분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그 몇 년 중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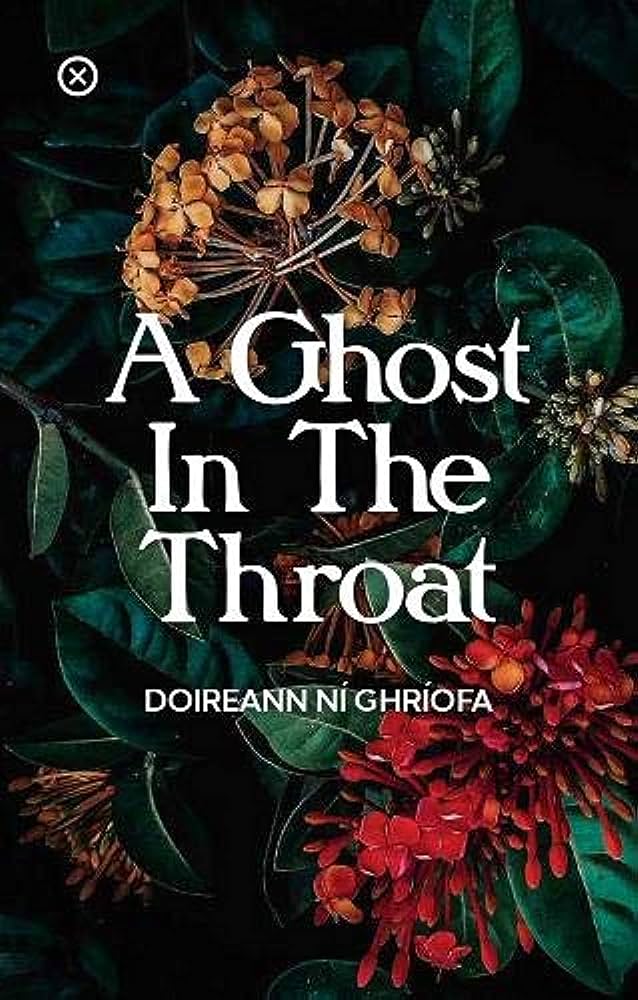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아일린 더브의 일생을 추적한 결과가, 영원한 수수께끼로 끝맺음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고백까지도 마음에 들었다. 어차피 그녀가 보여준 과정은 자체로 아름다웠기에.
‘이것은 여성의 텍스트다.’
마지막을 장식한 이 문장으로 인해 끝은 다시 시작으로 연결되고, 직물은 이어져서 영원한 고리를 이룬다. 이번에는 저 선언이 조금도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데리언이 언급한 엘렌 식수의 말에, 이토록 맞아 떨어지는 책은 다시 없을 테니까.
‘여성 안에는 언제나 최소한 약간의 좋은 모유가 남아 있다. 여성은 흰 잉크로 글을 쓴다.’
끝으로 자세한 작가와 책 소개 기사를 덧붙여 본다.
How one Irish writer’s obsession with an 18th-century poem began a quest to explore the erasure of women
Inspired by the visceral work of Eibhlin Dubh Ni Chonaill, Irish poet Doireann Ni Ghriofa draws parallels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in her acclaimed first book of prose
www.theglobeandmail.com
"본 게시물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제공하여 주신 을유문화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휴대용 가글이 미쳤다. 키들의 위력을 확인했어요! (2) | 2024.08.31 |
|---|---|
| 『목구멍 속의 유령』 (0) | 2023.08.22 |
| [서평] 인투 더 와일드 - “행복은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0) | 2022.06.20 |
| [서평] 바디 - 빌 브라이슨 (0) | 2022.06.20 |



